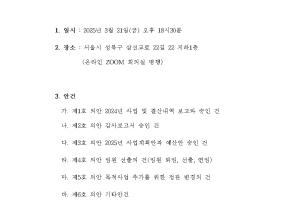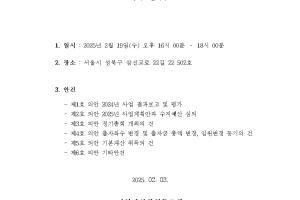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죽도-죽도 어촌앵커조직
활동가 전혜인

고흥에 온 지 어느덧 한 달째.
이렇게 빨리 적응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어느새 ‘고며들었다’.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울었는지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수시로 흐르는 눈물을 닦는 일이 꽤나 버거웠다.
적응을 잘하고 있음에도 왜 울었냐고 묻는다면, 이 따뜻한 고장의 사람들이 그 이유라고 말하고 싶다.
마을에 적응해가며 본부와도 소통하게 되었는데, 올해 활동가 에세이를 두 번 작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활동가라…… 내 정체성을 활동가로 규정지을 수 있을까?’
그 ‘활동가’라는 이름을 지우는 데만도 십여 년이 걸렸는데, 다시 활동가가 되어야 한다니!
함께 입사한 동기 팀장님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활동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요.”
그러자 동기 팀장님은 환한 얼굴로 이렇게 답하셨다.
“혜인 팀장님,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활동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활동가라는 단어의 무게 때문에, 오히려 그 단어를 멀리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그 단어를 멀리한 건, 나의 첫 커리어 때문이었을 것이다.
2011년, 부산의 한 마을에서 마을만들기 활동가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혼자 ‘사랑방’이라는 공간에 덩그러니 떨어져
마을 주민들과 밥상 모임을 하고, 아이들과 영화를 만들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마을의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해냈다. 혼자서.
그 속에서 여러 의문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이 활동들이 정말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재개발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을 텐데, 이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점점 무거워지는 마음들이 나를 짓눌렀고, 결국 2년 후 나는 활동가의 삶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15년이 흐른 지금, 다시 활동가가 되었다.
그 시절의 미숙함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여전히 고민은 많다.
그러다 문득, 고흥에서 보낸 이 한 달의 시간이 나에게 뜻밖의 배움이 되어주었다.
내가 다시 ‘활동가’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어떤 언어로 사람들과 만나야 할지를 가르쳐준 시간이었다.
고흥의 사람들은 조용하고도 깊은 방식으로 다가와 마음을 건넨다.
처음 인상 깊었던 건 버스 기사님이었다.
버스 안에서 어르신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가 아니었다.
삶의 리듬 속에 스며든 따뜻함, 사람을 향한 따스한 관심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낯선 길에서 작은 접촉사고가 났다.
순간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밀려왔지만, 포크레인 기사님은 먼저 내 걱정을 덜어주는 말을 건네셨다.
“괜찮아요, 내딸도 운전을 하고 다녀. 딸같아서 마음이 더 쓰이네?”
그 다정한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 무너지는 듯하면서도 다시 힘이 났다.
부산이었다면 큰소리부터 났을 텐데, 고흥에서는 마음부터 살펴주는 말이 먼저였다.
잊을 수 없는 건, 할머님들의 환대다.
어디를 가든, 손을 잡아주시고 웃어주셨다.
“아따 내딸 왔능가?”, “커피 한잔 먹고가?”, “키도 크고 너무 예쁜 거~”
이렇게 진심 어린 말들로 맞아주시는 따뜻한 손길.
내가 언제 이렇게 낯선 곳에서 환대를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다.
나는 이곳 고흥에서, 비로소 활동가로서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것.
용건부터 묻기보다는,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것.
정해진 형식이나 사업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말, 마음을 두드리는 언어로.
‘활동’보다 먼저 ‘사람’을 보고, ‘성과’보다 먼저 ‘마음’을 듣는 것.
그것이 고흥에서 내가 배운 활동가의 언어다.

 효율적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한 , 챗GPT 실전 활용 교육 후기
효율적 업무 체계 구축을 위한 , 챗GPT 실전 활용 교육 후기
 천천히, 마을과 나 사이에 놓인 시간을 걷는 중입니다.
천천히, 마을과 나 사이에 놓인 시간을 걷는 중입니다.